카테고리 없음
[박완규의 책읽기 세상읽기] (26) ‘산시로’ - 근대의 욕망과 불안/세계일보 /변영희 옮김
능엄주
2018. 9. 26. 12:00
![]()
[박완규의 책읽기 세상읽기] (26) ‘산시로’ - 근대의 욕망과 불안
기사입력 2018-09-24 0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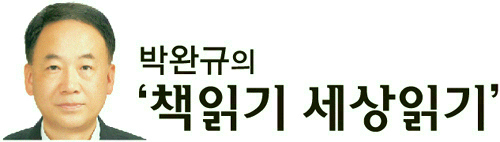
보수 성향이 강한 궁벽한 시골 구마모토 출신인 산시로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도쿄에 와서 많은 것에 놀란다. “가장 놀란 것은 아무리 가도 도쿄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 듯이 보였고 동시에 또 모든 것이 건설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엄청난 변화였다.” 그런 느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지금까지의 학문은 그 놀라움을 예방하는 데 약방에서 파는 약만큼의 효과도 없었다. 산시로의 자신감은 그 놀라움과 함께 40퍼센트나 줄어들었다.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다.”

왜 불쾌한가. “이 격렬한 활동 자체가 곧 현실 세계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현실 세계와 털끝만치도 접촉하지 않은 게 된다”는 것 때문이다.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가세할 수는 없다. 내 세계와 현실 세계는 하나의 평면에 나란히 있으면서도 조금도 접촉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현실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며 나를 남겨둔 채 가버린다. 심히 불안하다.” 세계는 격렬히 요동쳤고 산시로는 불안했다. 처음으로 도쿄 한복판에 선 산시로의 느낌이 그랬다.
도쿄는 구마모토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이었다. 산시로는 도쿄에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대를 접한 것이다. 재일동포 정치학자 강상중은 ‘청춘을 읽는다’에서 당시 제국의 수도 도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말하자면 제국의 수도라는 가상의 우산을 펼쳐 그 아래에 이질적인 것들을 결속시키려 한 것이다.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것이 거대한 배전반이 되고 새로운 인간과 물자, 정보와 문화가 순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도쿄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산시로는 자신에게 세 개의 세계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멀리 있다. … 모든 것이 평온한 대신 모든 것이 잠에 취해 있다. 하지만 돌아가는 데 수고할 필요가 없다. 돌아가려고 하면 당장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 다만 막상 그런 때가 되지 않으면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를테면 일시적인 도피처 같은 곳이다.” 고향인 구마모토다. 과거의 세계다.
“두 번째 세계에는 이끼 낀 벽돌 건물이 있다. … 양가죽, 소가죽, 2백년 전의 종이,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쌓인 먼지가 있다. 그 먼지는 2, 30년에 걸쳐 조금씩 쌓인 귀중한 먼지다. 조용한 미래를 이겨낼 만큼의 조용한 먼지다.” 대학의 학문이라는 현재의 세계다.
“세 번째 세계는 봄처럼 찬연히 흔들리고 있다. 전등이 있다. 은수저가 있다. 환성이 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거품이 이는 샴페인 잔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 으뜸가는 것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청년 산시로가 선망하는 세계다. 근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휘황찬란한 도쿄가 상징하는 미래의 세계다. “산시로에게는 이 세계가 가장 의미심장한 세계다. 이 세계는 바로 코앞에 있다. 다만 다가가기가 힘들다.”

근대에 접어든 일본의 욕망과 불안을 드러낸다. “산시로는 멀리서 이 세계를 바라보며 신기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이 세계 어딘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계 어딘가에 결함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자신은 이 세계 어딘가의 주인공이어야 할 자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원만한 발달을 간절히 바라야 할 이 세계가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여 자유롭게 출입해야 할 통로를 막고 있다. 산시로는 그것이 이상했다.”
산시로가 참석한 대학 집회에서 한 학생이 연설한 내용은 그 불안감 혹은 이상한 느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암시한다. “우리는 낡은 일본의 압박에 견딜 수 없는 청년이다. 동시에 새로운 서양의 압박에도 견딜 수 없는 청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다. 새로운 서양의 압박은 사회상에서도 문예상에서도 우리들 신시대의 청년에게는 낡은 일본의 압박과 마찬가지로 고통이다.”
소설에선 신약성서에 나오는 ‘스트레이 십(stray sheep)’, 길 잃은 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산시로가 좋아했던 여자 미네코가 알려준 말이다. 소설의 끝 부분은 ‘숲속의 여인’이라는 그림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미네코를 모델로 한 그림이다. 산시로는 그림 제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뭐라고 하면 좋겠나”라는 친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입속으로, 스트레이 십, 스트레이 십, 이라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소세키는 그가 살던 시대야말로 길 잃은 양이라고 여긴 건 아닐까. 일본보다 더 늦게, 더 급하게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욕망과 불안, 그에 따른 고통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출처 :세계일보